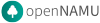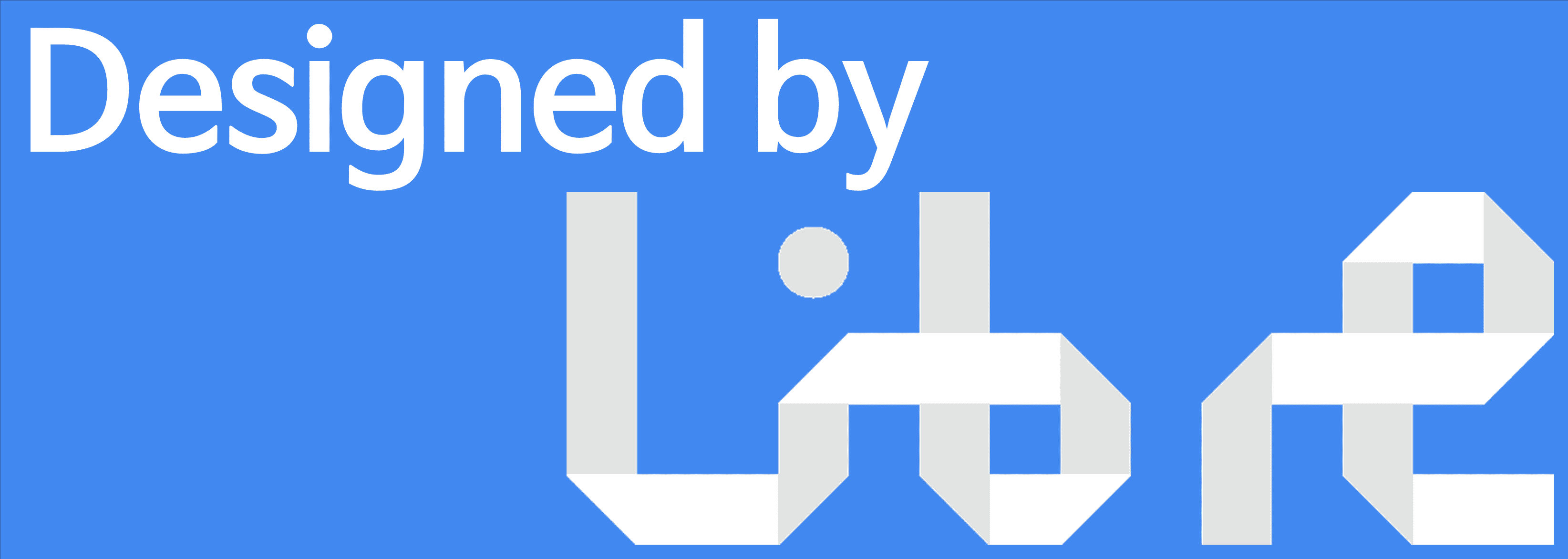[[분류:가져온 문서/오메가]]
連續函數 / Continuity Function
연속이란 함수의 유용한 성질 중 하나로 해석학, 위상수학에서 여러모로 많이 쓰인다.
== 정의 ==
먼저 [math(f:\Bbb{R}\to \Bbb{R})]이라는 함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모든 [math(\varepsilon>0)]에 대해서 적당한 [math(\delta>0)]이 있어서 [math(a\in \Bbb{R})]에서 다음 명제가 만족된다고 하자.
* 모든 [math(|x-a|<\delta)]를 만족하는 [math(x)]에 대해서 [math(|f(x)-f(a)|<\varepsilon)]이 만족된다.
그러면 [math(f)]는 [math(a)]에서 연속이라고 말한다. [math(A)]가 [math(\Bbb{R})]의 부분집합일 때 [math(f)]가 [math(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연속이면 [math(f)]를 [math(A)]에서 연속이라고 말한다.
== 이해 ==
연속이란 직관적으로 '끊어지지 않았다'를 뜻한다. 끊어지지 않았다면 [math(f)]의 그래프 중 어떤 점을 잡아서 그 점을 무한히 [math(a)]에 갖다 대면 그 점은 무한히 [math((a,f(a)))]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math(x)]를 [math(a)]에 무한히 가까지 가져가면 [math(f(x))]는 [math(f(a))]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뜻이다. 이 직관은 다음으로 엄밀화할 수 있다.
* 모든 [math(|x-a|<\delta)]를 만족하는 [math(x)]에 대해서 [math(|f(x)-f(a)|<\varepsilon)]이 만족된다.
바로 위의 정의에서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한 그 명제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모든 [math(\delta>0)]에 대해서 적당한 [math(\varepsilon>0)]이 있어서' 라고 서술되는 게 아닌 '모든 [math(\varepsilon>0)]에 대해서 적당한 [math(\delta>0)]가 있어서'라고 서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 두번째 형태로 서술되어야 하는지는 첫번째 서술이 연속의 정의라고 하고 [math(f(x)=x^2)]이라는 함수를 예로 들어 알아보자.
[math(f(x)=x^2)]은 [math(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가파라지고 결국 거의 [math(y)]축에 평행하는 정도가 되어버린다. 당연히 [math(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math(a)]를 충분히 크게 잡아보자. 그리고 [math(\delta>0)]를 하나 잡고 [math(|x-a|<\delta)]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적당한 [math(\varepsilon>0)]이 있어서 [math(|x^2-a^2|<\varepsilon)]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 [math(|x^2-a^2|=|x-a||x+a|)]
이고 [math(a)]를 적당히 크게 하면 [math(\delta)]에 상관없이 적당한 [math(a)]가 있어서 [math(|x^2-a^2|)]은 [math(1)]보다 커질 수 있게 된다.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해보면 [math(a)]부분의 그래프는 너무 가파라서 [math(\delta)]를 잡아도 적당한 [math(\varepsilon)]이 생길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math(f(x)=x^2)]은 다음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모든 [math(\delta>0)]에 대해서 적당한 [math(\varepsilon>0)]이 있어서 [math(|x-a|<\delta)]이면 [math(|f(x)-f(a)|<\varepsilon)]이다.
그러니까 [math(f(x))]는 연속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만다. 결국 위와 같은 서술은 '끊어지지 않는 그래프'라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 모든 [math(\varepsilon>0)]에 대해서 적당한 [math(\delta>0)]이 있어서<math>\cdots</math>
와 같이 수정한다면 직관적으로 틀렸다고 한 서술의 직관을 포함하면서 '가파라서'라는 이유를 무시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가파르든 [math(y)]값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니까 상관없는 것이다.
== 같은 정의 ==
[math(f:\Bbb{R}\to \Bbb{R})]이 실수집합의 부분집합 [math(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다음들과 동치다.
* [math(a\in A)]일 때 [math(\displaystyle \lim_{x\to a}f(x)=f(a))]가 성립한다.
* 모든 [math(f(A))]의 open set [math(U)]에 대해서 [math(f^{-1}(U))]가 [math(\Bbb{R})]에서 open이다.
* [math(a\in A)]로 수렴하는 [math(A)]의 수열 [math(\{x_n\})]에 대해서 <math>\lim_{n\to \infty}f(x_n)=f(a)</math>이다.
== 예제 ==
=== 연속함수 ===
* 모든 다항함수
* [math(\sin x, \cos x)]
* [math(y=a^x\ (a>0))]
=== 불연속함수 ===
*[math(f(x)=\displaystyle \frac{g(x)}{h(x)}\ (g(x))]와 [math(h(x))]는 연속함수[math())]
* 이 함수는 [math(h(x)=0)]을 만족하는 [math(x)]값에서 불연속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math(f(x)=\begin{cases}x & \text{if}\;x\ne 0 \\ 1 & \text{otherwise}\end{cases})]
* 이 함수는 [math(x=0)]에서 불연속이다. 그래도 이것은 [math(x=0)]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이다.
*[math(f(x)=\begin{cases} 1& \text{if}\;x\;\text{rational (유리수)} \\ 0 & \text{if}\;x\;\text{irrational (무리수)}\end{cases})]
* 이 함수는 실수 집합 전체에서 정의되면서 실수 집합 전체에서 불연속이다.[* 참고로 이는 실수 집합의 모든 폐구간에 대해서 리만 적분 가능이 아니기도 한다.]
== 일반화 ==
이는 일반적인 위상공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이 때 연속성은 다음으로 서술된다.
* [math(X)]와 [math(Y)]가 위상공간이고 [math(f:X\to Y)]가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math(f)]가 연속이라는 것은 [math(U)]가 [math(Y)]의 [[개집합]]일 때 [math(f^{-1}(U))]가 [math(X)]의 open set인 것이다.
위에서 쓴 '[math(\delta>0)]에 대해서 적당한 [math(\varepsilon>0)]이 있어서<math>\cdots</math>'
이라는 서술은 개사상이라는 개념으로 일반화되며 다음으로 서술된다.
* [math(f:X\to Y)]가 개사상이라는 것은 [math(U)]가 [math(X)]의 개집합일 때 [math(f(U))]는 [math(Y)]의 개집합이란 것이다.
== 영상 ==
[youtube(dZE21k6Vjys)]
[Include(틀:가져옴2,O=오메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