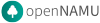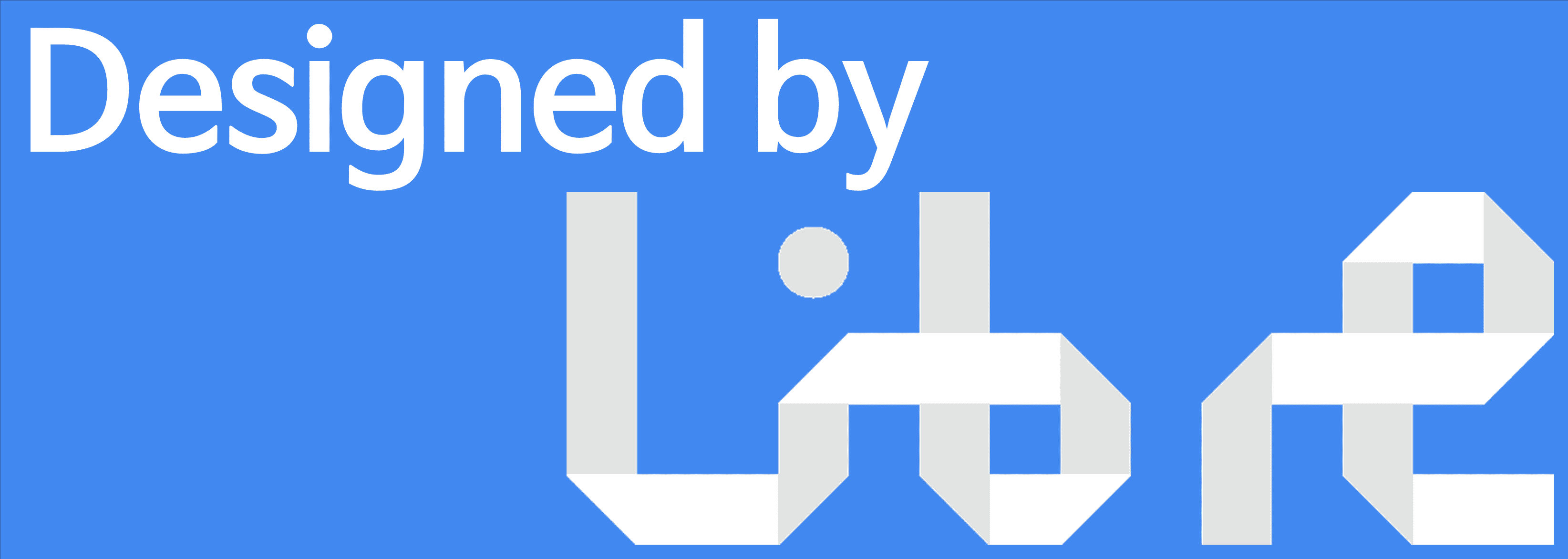[[분류:가져온 문서/오메가]]
Orbital
원자나 분자 내의 전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 원자 오비탈 ==
보어의 원자 모형은 자기장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수소 원자의 새로운 스펙트럼과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 후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개념이 도입된 오비탈을 제시하였고 전자에 관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 도입 ===
프랑스의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들은 파동의 성질을 지녔다는 물질파 이론을 1923년에 제시하였다. 그는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닫힌 경로에서 정상파를 이루며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산적[* [[양자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이라는 것을 보였다. 파동에 대한 드브로이 관계에 의해 닫힌 경로의 길이 [math(L)]에서의 정상파의 파장 [math(\lambda)]는 자연수 [math(n)]에 대해
[math(\lambda=\frac{h}{mv}=\frac{L}{n})]
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 [math(h)] 는 플랑크 상수이다. 닫힌 경로를 원이라고 하면 [math(L=2\pi r)] 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가 받는 구심력은 전자기력이므로
[math(\frac{mv^2}{r} = \frac{k}{r^2})]
가 성립하고, 두 식을 연립하면 [math(r)] 은 [math(n^2)] 에만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math(E = \frac{1}{2} mv^2 - \frac{k}{r} = - \frac{k}{2r})]
에서 [math(r)] 에만 의존하므로 이산적이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뢰딩거]]는 이 점에 착안하여 수소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마침내 그의 슈뢰딩거 방정식에 의한 해석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1926년에 입증하였다. 시간에 무관한 다음 슈뢰딩거 방정식
[math( E \psi (\vec{x}) = \left ( - \! \frac{{h}^{2}}{8\pi^2 m} \! {\nabla}^{2} + {E}_{\text{p}} \right ) \psi (\vec{x}) )]
에서 [math(E_\text{p})] 를 수월하게 다루려면 공간에 대한 파동 함수 [math(\psi (\vec{x}))]를 절댓값 [math(r)] 과 극각 [math(\theta)] 와 방위각 [math(\phi)] 에 대한 구면 좌표계에서 [math(\Theta(\theta))] 과 [math(\Phi(\phi))] 와 [math(R(r))] 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임의로 놓은 상수 [math(m_l)] 과 [math(l)] 에 대해 다음 세 방정식으로 분리된다.
[math(\frac{\mathrm{d}\Phi}{\mathrm{d}\phi ^2} = - m_l^2 \Phi ,\ \frac{1}{\sin\theta} \frac{\mathrm{d}}{\mathrm{d}\theta}(\sin\theta\frac{\mathrm{d}\Phi}{\mathrm{d}\theta})+(l^2+l - \frac{m_l^2}{\sin^2\theta})\Phi=0)]
[math(\frac{1}{r^2}\frac{\mathrm{d}}{\mathrm{d}r}(r^2 \frac{\mathrm{d}R}{\mathrm{d}r})+(\frac{8\pi^2 m}{h^2}(\frac{k}{r}+E)-\frac{l^2+l}{r^2})R = 0)]
이 방정식이 유의미한 해를 가진다면 [math(m_l)] 은 정수여야 하고, [math(l)] 은 [math(|m_l|)] 이상의 정수여야 한다. 게다가, [math(r)] 은 [math(n^2)] 에만 비례하므로 [math(n)] 을 도입하면 [math(E)] 는 [math(n)] 에만 의존한다. 각 상수를 정하면 그 조건에서의 원자의 완전한 파동 함수를 구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물리학자 보른은 임의의 한 지점에 대한 파동 함수의 크기가 그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진폭을 나타낸다고 해석하였고, 인정받아 현대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제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므로 공간의 임의의 한 지점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알 수 있으며, 전자의 분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그 함수를 주양자수가 [math(n)] 이고 방위 양자수가 [math(l)] 이며 자기 양자수가 [math(m_l)] 인 오비탈이라고 한다.
덧붙여,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전자 한 개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1927년에 제시하였다. 전자와 같이 작은 질량을 가진 입자는 측정을 위한 빛에 부딪히면 운동량이 변하므로 위치 [math(x)] 의 측정 불확정성 [math(\Delta x)] 와 운동량 [math(mv)] 의 측정 불확정성 [math(\Delta(mv) )] 는 다음 한계를 갖는다.
[math(\Delta x \Delta(mv) \geq \frac{h}{4\pi})]
그러므로 전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된다면 전자의 속도는 알 수 없고, 전자의 속도가 정확하게 결정된다면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상세한 경로를 예측할 수 없고 슈뢰딩거 방정식을 통해 임의의 한 지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표현 ===
특정한 원자에 대한 특정한 오비탈은 공간 상의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된다. 우리는 핵 주위를 구름처럼 분포하는 전자가 넓은 영역에 걸쳐서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점밀도 그림
* 경계면 그림
=== 구성 ===
각 오비탈은 주양자수(n), 방위 양자수(l), 자기 양자수(m)에 의해 결정된다.
=== 종류 ===
각 오비탈은 형태를 결정하는 방위 양자수에 따라 [math(s,\ p,\ d,\ f)] 오비탈[* 각각 sharp, principal, diffuse, fundamental 의 줄임으로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표현이 굳어진 것이다.]로 나뉘며, 주양자수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앞에 주양자수를 붙여 [math(1s,\ 2s,\ 3s, \cdots)] 와 같이 나타낸다.
====[math(s)] 오비탈====
[math(\psi)]는 [math(\theta, \phi)]와 독립적이어서 모든 [math(s)] 오비탈은 핵을 중심으로 구면 대칭성을 가진다. 주양자수가 높아질수록 마디의 개수가 많아진다.
==== [math(p)] 오비탈[* 절대 비오비타~♬가 아닙니다.] ====
분포되어 있는 축의 방향에 따라 p,,x,, p,,y,, p,,z,,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math(d)] 오비탈====
====[math(f)] 오비탈====
===명명===
* 분자 오비탈: 원자 오비탈의 확장으로, 원자 오비탈과 혼성 오비탈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한 전자의 분포를 다룬다.
* 혼성 오비탈
== 영상 ==
[youtube(9HwP1wPA7zw)]
[Include(틀:가져옴2,O=오메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