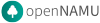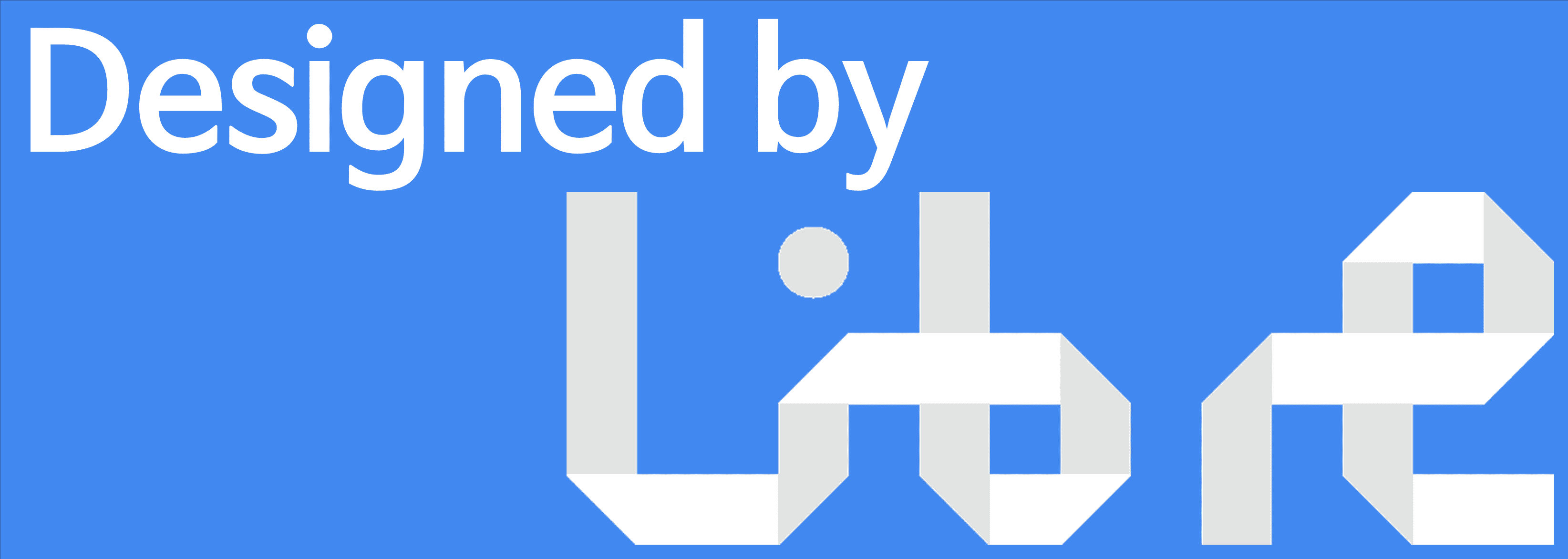[[분류:가져온 문서/오메가]] [[외부:https://pbs.twimg.com/media/DrPoTCeX4AEJ9i5?format=jpg&name=4096x4096|width=500]] Fermat's Last Theorem (FLT) 수학계의 유명한 정리로 페르마가 처음 추측했다가 앤드류 와일즈가 증명한 정리로, 다음과 같다. >Generaliter nullam in infinitum vltra quadratum poteſtatem in duos eiuſdem nominis fas eſt dividere. >일반적으로 3 이상의 지수를 가진 정수는 이와 동일한 지수를 가진 다른 두 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것은 증명되기 전에는 수학계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유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증명이 가능한지 회의를 느꼈고 심지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불가능할거라고 믿은 사람도 있었다. == 설명 == 이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지수만 살짝 바꾼 거라고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math> x^2+y^2=z^2</math> 꼴인데 이를 만족하는 서로 [math(0)]이 아닌 정수는 [math(x,y,z)]는 [math(3,4,5)]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math> 3^2+4^2=5^2</math> 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math> 5^2+12^2=13^2</math> 역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수 [math(k,a,b)]가 있어서 [math(x^2+y^2=z^2)]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는 ><math>x=k(a^2-b^2),\;\;y=2kab,\;\;z=k(a^2+b^2)</math> 꼴이며 이 꼴은 모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한다. 그러면 다음은 어떨까? ><math> x^3+y^3=z^3</math> 이것 역시 해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math(x,y,z)] 셋 중 하나가 [math(0)]이 되지 않는 이상 해가 없다. 이는 오일러가 처음으로 증명했으며 오일러는 이 증명에 [[유일 인수분해 정역]]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좀 어려워서 여기에서 증명은 생략한다. 이제 다음은 어떨까? ><math> x^4+y^4=z^4</math> 이것은 [math(x,y,z)] 셋 중 하나가 [math(0)]이 아니고는 해가 없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아마도 페르마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일반화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경우는 [math(x,y,z)]가 서로 서로소라고 하면 ><math>x^2=a^2-b^2,\;\; y^2=2ab,\;\;z^2=a^2+b^2</math> 꼴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math(y)]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math(y)]가 짝수이면 [math(y^2)]은 [math(4)]의 배수가 되어야 하므로 [math(a)]나 [math(b)]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 [math(a)]가 짝수라고 하면 ><math>x^2+z^2=2a^2</math> 이고 그러므로 [math(x^2+z^2\equiv 0 \pmod 4)]가 된다. 이걸로 간단한 계산으로 [math(x)]와 [math(z)]는 동시에 짝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math(x,y,z)] 모두 짝수가 되는데 이는 [math(x,y,z)]가 서로 서로소라는 데 모순이다. 이제 지수를 더 높혀서 다음을 보자. ><math> x^5+y^5=z^5</math> 이 경우에도 역시 [math(x,y,z)] 셋 중 하나가 [math(0)]이 아니고는 해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수학자 소피 제르맹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지수를 끝없이 높혀가다보면 우리는 다음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math(n\ge 3)]와 정수 [math(x,y,z)]에 대해서 <math> x^n+y^n=z^n</math>꼴의 방정식이 성립하면 [math(xyz=0)]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명해 외에 이 방정식의 해는 없다. 이것은 1994년 영국의 수학자 앤드루 와일즈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 일화 == 페르마는 이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는지 디오판토스의 산술에 이 정리를 써놓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혔다. >Cuius rei demonstrationem mirabilem sane detexi hanc marginis exiguitas non caperet. >나는 이것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증명하였으나, 책의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 옮기지는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큰 화제가 되었고 [[페르마의 여백 정리]]라고 불리는 등 많은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정말로 페르마는 17세기 초에 스스로 [[타원 곡선]]과 modular form, 이 둘을 연결하는 representation theory와 그 representation을 만드는 데 필요한 cohomological theory를 스스로 만들고 modularity theorem를 스스로 생각해서 증명했던 것일까? 진짜 페르마가 이것들을 모두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천재라면 저 여백정리를 쓴 것도 이해가 갈 텐데 말이다. == 영상 == [youtube(3c4Sq2F6o8M)] [Include(틀:가져옴2,O=오메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