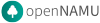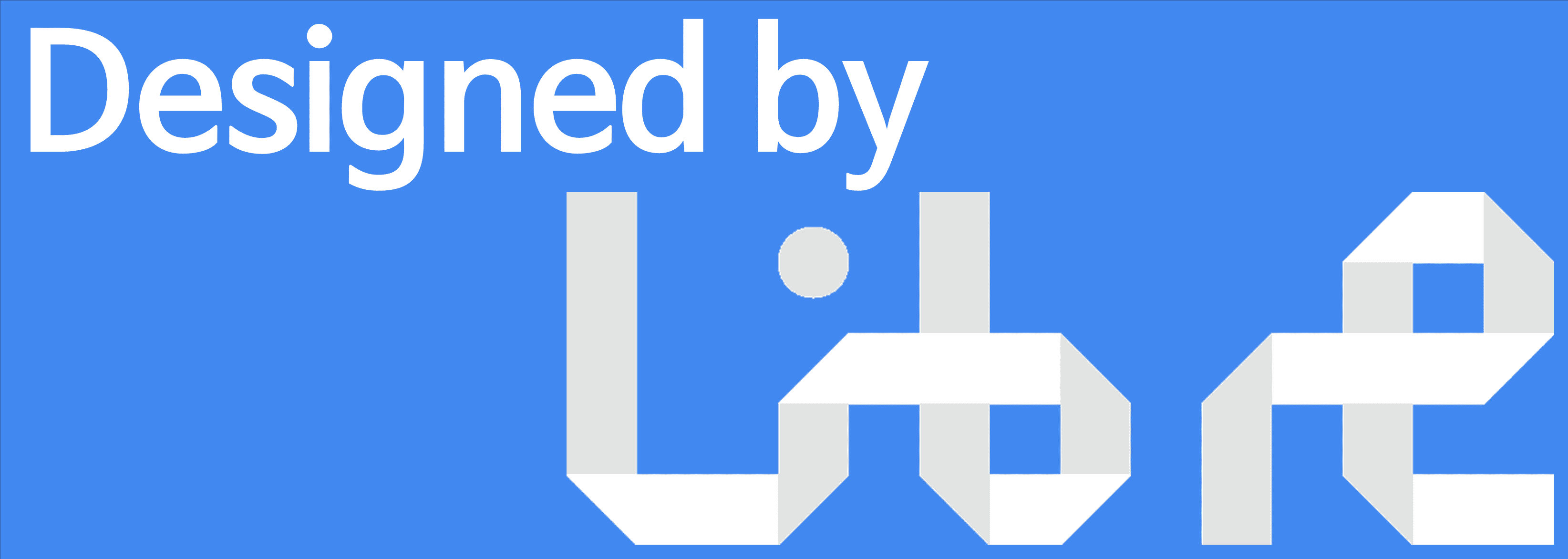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법파동의 목록이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으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6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6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6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6차 사법파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1. 1차 ✎ ⊖
검찰은 1971년 7월 사법부를 탄압할 목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이범렬 부장판사 등 2명과 서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달 28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37명이 항의 사퇴하면서 전국적인 사법부 수호 운동이 촉발됐다. 415명의 판사 중 총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8월 27일 판사들이 사표를 철회하고 두 판사가 사임하면서 일단락되었다.
2. 2차 ✎ ⊖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김용철 대법원장의 재임명이 이뤄지자 재판장 335명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유신악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임하고 정기승 대법원 판사로 교체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돼 이일규 대법원장이 최종 취임했다.
3. 3차 ✎ ⊖
1993년 6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가운데, 5월에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젊은 판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시환, 강금실, 김종훈을 비롯한 서울지법 민사 단독 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 건의문에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흔들렸던 사법부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었고, 법관의 관료화를 막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소신 있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주장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법관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법관 회의의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이 사건은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으로 마무리되었고, 3차 사법 파동 이후 법관 회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개혁안이 몇몇 제도를 손질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임으로 마무리되었고, 3차 사법 파동 이후 법관 회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소장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혁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는 개혁안이 몇몇 제도를 손질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