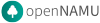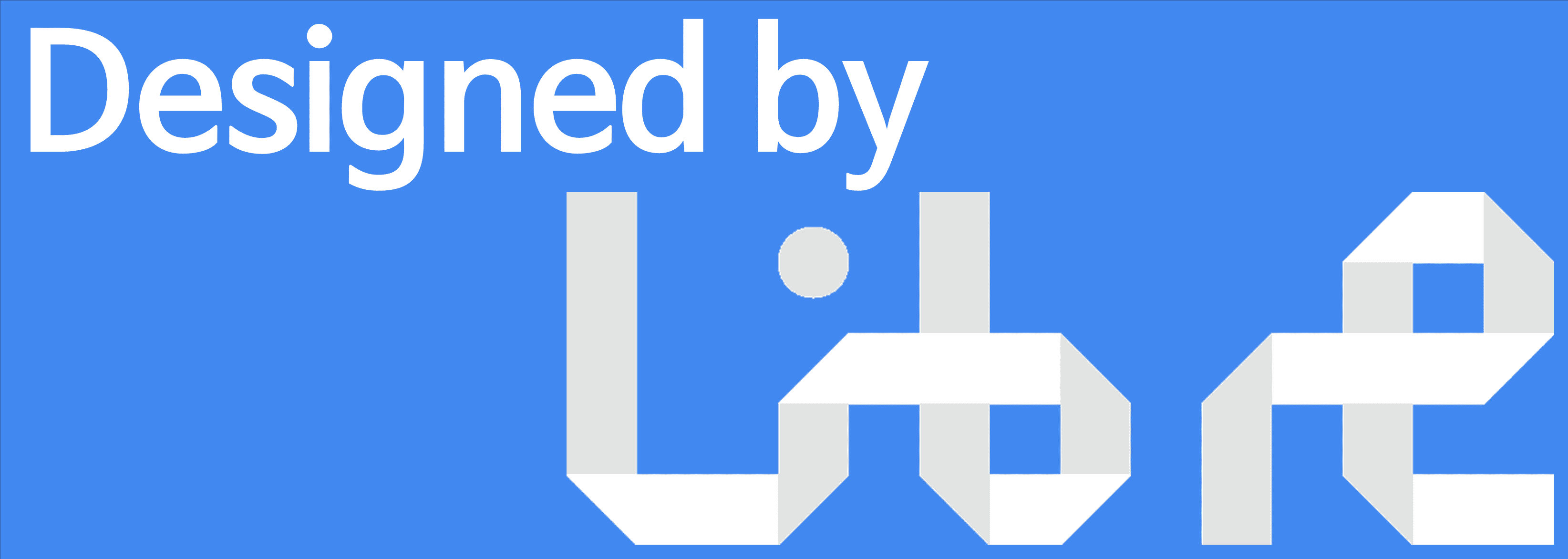(+)분류 : 가져온 문서/진보위키
奴婢
奴婢傳世, 亘古今通四海無有者也。無徳不材而不思猷, 為坐役臧獲, 遍走推覔, 猥刼傾産, 使之失所乃已也。
노비 신분을 대대로 전하는 것은 고금과 세상을 통틀어서 없었던 것이다. 가진 게 없고 재주가 없고 생각이 깊지 못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 종으로 만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고, 함부로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고 살 곳을 잃게 만들고야 만다.
《성호사설(星湖僿說)》권지십이(卷之十二) 〈인사문(人事門)〉 '육두(六蠹)'
1. 개요 ✎ ⊖
중국과 한반도에 있었던 신분 계층. 이 문서에서는 한반도의 내용을 중점으로 서술한다.
가장 많을 때인 17세기 초·중반 조선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기본적으로 양반들에게 노동력과 재화를 수탈당하는 계층이었으며 노주(奴主)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여자 노비[婢]들은 더한 것도 당했다. 물론 항변할 권리는 사실상 없었다.
가장 많을 때인 17세기 초·중반 조선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기본적으로 양반들에게 노동력과 재화를 수탈당하는 계층이었으며 노주(奴主)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여자 노비[婢]들은 더한 것도 당했다. 물론 항변할 권리는 사실상 없었다.
2. 가축보다 못한, 동정받지 못한 ✎ ⊖
조선의 노비들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도야지', '두꺼비'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당했다. 이는 동시대의 양반·양인은 물론이고 전대인 고려의 노비와도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짐승 이름이면 그나마 괜찮은 거였다. 노비들은 '썩을년', '모진놈', '노랑이', '망나니', '말종'처럼 저열함을 나타내거나, '개똥', '말똥', '물똥', '똥싼이', '똥녀[糞女]', '방귀'처럼 더러움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심지어 이름이 '시체'인 노비도 있었다.(1)
오늘날 일부 국수주의적인 역사 학자/동호인들은 조선의 노비들이 받은 '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절절이 말을 늘곤 하지만, 실제 노비에 관한 사료들을 살펴 보면 당시 양반 사대부 계층이 노비에 대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며 느끼는 것만큼의 동정심이나 지니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작성자 묵재 이문건이 노비에게 체벌을 가한 기록이 수백 건이나 나타난다. 물건 잃어버렸다고 패고, 부르는데 빨리 안 왔다고 패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패고, 거문고에 기러기발이 없어졌다고 패고, 말먹이 주는 걸 걸렀다고 패고, 말 먹을 물이 없다고 패고, 그릇 깨끗이 안 씻었다고 패고, 책이 물에 젖었다고 패고, 밥때 늦었다고 패고, 국 제대로 안 익었다고 패고, 제사 음식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패고, 잠자리 미리 안 펴 놨다고 패고, 이 안 잡았다고 패고, 말이 넘어졌다고 패고, 연못에 물 안 채워넣었다고 패고, 손님 왔을 때 떠들었다고, 머리 안 빗었다고 팼다.
'이문건 구타 전설' 중에서는 특히 '주인 집 아기'(2) 시리즈가 볼 만하다. 이문건은, 주인 집 아기를 보다가 실수로 눈을 건드려서 울게 만들었다고 비 돌금에게 매를 댔고, 한 번은 낙서를 하는 것을 못 막았다고, 다른 한 번은 방죽 위에 올라가게 했다고, 또 한 번은 벽에 밀쳐서 울렸다고 비 옥춘를 후려갈겼으며, 애를 놔 두고 먼저 들어왔다고 노 작은손과 필이를 때렸고, 거지 흉내를 시켰다고 노 종만을 손수 몽둥이로 구타했다. 자신의 아이는 귀한 줄 알면서 노비는 그냥 동물처럼 취급한 거다.(3)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오희문이라는 양반이 쓴 일기인 《쇄미록(瑣尾錄)》을 보면, 계집종이 죽어가는데 밥 지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거나, 노비의 죽음에 대해, 오희문 본인이 그 죽음에 책임이 있거나 자신이 '훌륭한 노비'라고 인식한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不惜]"고 말하는 것이 양반들이 노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었다.(4)
조선 말의 문인인 서유영(徐有英)은 본인의 저서 《금계필담(錦溪筆談》에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정조, 순조대에 한성부판윤,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이기 했던 이서구가 젊은 시절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노비를 때려 죽이고 그 일을 '조용하게 처리한' 즉 관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일화를 '미담'으로 여겨 수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양반들에게 노비를 맘대로 죽일 권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노비제가 해체 중'이었다고 하는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다.(5)
그렇게 노비라는 이유로 학대와 살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조선의 양반 노비주들이 노비 신분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존중했을지는 불문가지다.
오늘날 일부 국수주의적인 역사 학자/동호인들은 조선의 노비들이 받은 '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절절이 말을 늘곤 하지만, 실제 노비에 관한 사료들을 살펴 보면 당시 양반 사대부 계층이 노비에 대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대하며 느끼는 것만큼의 동정심이나 지니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16세기 중반에 작성된 《묵재일기((默齋日記)》에는, 작성자 묵재 이문건이 노비에게 체벌을 가한 기록이 수백 건이나 나타난다. 물건 잃어버렸다고 패고, 부르는데 빨리 안 왔다고 패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패고, 거문고에 기러기발이 없어졌다고 패고, 말먹이 주는 걸 걸렀다고 패고, 말 먹을 물이 없다고 패고, 그릇 깨끗이 안 씻었다고 패고, 책이 물에 젖었다고 패고, 밥때 늦었다고 패고, 국 제대로 안 익었다고 패고, 제사 음식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 패고, 잠자리 미리 안 펴 놨다고 패고, 이 안 잡았다고 패고, 말이 넘어졌다고 패고, 연못에 물 안 채워넣었다고 패고, 손님 왔을 때 떠들었다고, 머리 안 빗었다고 팼다.
'이문건 구타 전설' 중에서는 특히 '주인 집 아기'(2) 시리즈가 볼 만하다. 이문건은, 주인 집 아기를 보다가 실수로 눈을 건드려서 울게 만들었다고 비 돌금에게 매를 댔고, 한 번은 낙서를 하는 것을 못 막았다고, 다른 한 번은 방죽 위에 올라가게 했다고, 또 한 번은 벽에 밀쳐서 울렸다고 비 옥춘를 후려갈겼으며, 애를 놔 두고 먼저 들어왔다고 노 작은손과 필이를 때렸고, 거지 흉내를 시켰다고 노 종만을 손수 몽둥이로 구타했다. 자신의 아이는 귀한 줄 알면서 노비는 그냥 동물처럼 취급한 거다.(3)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오희문이라는 양반이 쓴 일기인 《쇄미록(瑣尾錄)》을 보면, 계집종이 죽어가는데 밥 지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거나, 노비의 죽음에 대해, 오희문 본인이 그 죽음에 책임이 있거나 자신이 '훌륭한 노비'라고 인식한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不惜]"고 말하는 것이 양반들이 노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었다.(4)
조선 말의 문인인 서유영(徐有英)은 본인의 저서 《금계필담(錦溪筆談》에 당대의 대문장가이자 정조, 순조대에 한성부판윤,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이기 했던 이서구가 젊은 시절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노비를 때려 죽이고 그 일을 '조용하게 처리한' 즉 관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일화를 '미담'으로 여겨 수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양반들에게 노비를 맘대로 죽일 권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노비제가 해체 중'이었다고 하는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다.(5)
그렇게 노비라는 이유로 학대와 살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조선의 양반 노비주들이 노비 신분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얼마나 존중했을지는 불문가지다.
3. '갑부 노비'의 아이러니 ✎ ⊖
잘 알려진대로 노비는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성종대 충청도 진천에 살았던 임복이라는 노비는 흉년이 들자 무려 2000석의 곡식을 나라에 바쳤다.(6) 국가에 헌납한 것만 2000석이었으니 전체 재산은 수만 석에 달했을 것이고 실제로 조정에서 파악한 규모도 그러했다. 이런 사례를 두고 생각이 짧은 이들은 노비도 얼마든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조선이란 나라의 넉넉함을 치켜세우곤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조차 '말하는 가축' 취급 받던 노비 신분을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일까?
노비가 만석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그다지 눈여겨 볼 점이 없다. 노비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사회 최하층 신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전근대의 신분 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비가 갑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갑부여도 노비라는 현실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 다음에 조정에서 오고간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성종은 임복의 헌납을 갸륵하게 여겨 특별히 면천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가까이에 있는 승지들이 반대를 했다. 성종은 임복 본인은 제쳐두고 그 자식들이라도 면천시켜 주려고 했으나 역시 반대가 들끓었다.(7) 임복의 헌납은 종량(從良: 천인 신분에서 풀려나 양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양천의 분별은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과 같아서 결코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良賤之分, 如天建地設, 不可移易] 그와 같은 행동은 국가에 대해서는 공이 된다고 해도 그 주인이 보기에는 반역이 되는 것이며[雖於國家有功, 以其主視之, 則橫逆之奴也] 만약 바라는 바를 들어줄 경우 이를 따라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背主者蜂起]이 주된 반대 논거였다. 한 마디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가의 관료로서 정체성보다 노예주로서 정체성을 우선했고, 따라서 이들은 본인 소유의 노비가 국가와 직접 거래해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복은 추가로 1000석을 더 바치고 끝내 자식 넷 모두의 종량을 얻어내고야 말았다.(8) 하지만 모든 고위 관리들이 노비주였던 조선에서 그와 같은 일은 재현되기 힘들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다른 노비가 똑같이 곡식 2000석을 바쳤을 때, 성종은 그것이 임복처럼 면천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고 곡식을 받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9)
하지만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왜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조차 '말하는 가축' 취급 받던 노비 신분을 벗어던질 수 없었던 것일까?
노비가 만석꾼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그다지 눈여겨 볼 점이 없다. 노비에게 재산권을 인정한다면, 그 상한을 정하지 않는 이상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큰 부자가 되고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던 사회 최하층 신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전근대의 신분 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비가 갑부라는 사실이 아니라 갑부여도 노비라는 현실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건 다음에 조정에서 오고간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성종은 임복의 헌납을 갸륵하게 여겨 특별히 면천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당장 가까이에 있는 승지들이 반대를 했다. 성종은 임복 본인은 제쳐두고 그 자식들이라도 면천시켜 주려고 했으나 역시 반대가 들끓었다.(7) 임복의 헌납은 종량(從良: 천인 신분에서 풀려나 양인이 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양천의 분별은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것과 같아서 결코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良賤之分, 如天建地設, 不可移易] 그와 같은 행동은 국가에 대해서는 공이 된다고 해도 그 주인이 보기에는 반역이 되는 것이며[雖於國家有功, 以其主視之, 則橫逆之奴也] 만약 바라는 바를 들어줄 경우 이를 따라서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背主者蜂起]이 주된 반대 논거였다. 한 마디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국가의 관료로서 정체성보다 노예주로서 정체성을 우선했고, 따라서 이들은 본인 소유의 노비가 국가와 직접 거래해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임복은 추가로 1000석을 더 바치고 끝내 자식 넷 모두의 종량을 얻어내고야 말았다.(8) 하지만 모든 고위 관리들이 노비주였던 조선에서 그와 같은 일은 재현되기 힘들었다. 실제로 얼마 후에 다른 노비가 똑같이 곡식 2000석을 바쳤을 때, 성종은 그것이 임복처럼 면천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고 곡식을 받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다.(9)
4. 그들이 이러한 취급만 받았나? ✎ ⊖
이러한 취급만 받았다. 조선 왕조 전기간에 걸쳐 양반들은 자기 소유의 노비를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생사 여탈권도 손에 쥐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가 노비 죽인 죄를 물어 주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지금 와서 국수주의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 봐야, 당대의 외부 관찰자들이 본 조선 노비들의 처지는 그러했다.
참고로 위의 프랑스 외교문서에서 지적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을 제정한 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한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시다.
여자 노비를 죽인 사람은 주인에게 3배에 이르는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주인을 죽인 노비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 주인은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노비를 죽일 수 있다.
헨드릭 하멜 지음, 유동익 옮김, 《하멜 보고서》, 2003, 중앙M&B, 55쪽.
노비는 죽을 때 까지 살아야 하는 집에 일단 들어가면 심한 노역을 강요당합니다.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노비를 다루며 노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노비를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다 해도 처벌은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며 실제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처벌을 피하고 만일 주인이 고위 관리나 양반이면 걱정을 끼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노비는 아무리 심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자신을 소유한 주인을 고소할 권리가 없으며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면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노비가 탈출을 시도하게 되면 뒤좇아 오는 하인들에게 쉽게 붙들리거나 길가는 행인에게 납치될 것입니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관아에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주인집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35) 조선의 노비제도에 관한 보고, 〈정치공문 1888~1896 조선 1890 권3 콜랭 드 플랑시 씨〉,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 4 조선Ⅲ·1890》, 2005.
참고로 위의 프랑스 외교문서에서 지적한,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을 제정한 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한국사 최고의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시다.
5. 한국 사회의 노비제 예찬 ✎ ⊖
조선 노비 문제에 관한 한,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대다수 역사 오타쿠들은 관련 자료를 조금만 찾아봐도 쏟아져 나오는 노비에 대한 온갖 학대의 증거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반면, 노비제 미화에 도움이 될 만한 일화들은 참 다들 열심히도 주워먹는다. 주인이 노비가 제사 지내는 걸 도와주기도 했느니 아프면 약도 지어 줬느니 어쩌느니 하는 얘기들을 '미담'이랍시고 늘어놓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노비는 조선(특히 전기)의 양반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자기 물건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같은 지붕을 이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가축이라도 다치고 병들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낫게 해주려고 한다. 조선은 말의 건강을 보살피는 마의(馬醫)가 있던 나라다. 하다 못해 집에서 쓰던 의자 다리가 부러져도 당장 버리기보다는 고쳐쓰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병에 걸린 노비를 바로 용도폐기 안하고 치료해 줬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처우'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참고로 그 '미담'에 등장하는 '착한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 구타 전설의 주인공 묵재 이문건이다. 이문건은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는 데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학에도 나름 상당한 관심과 지식이 있던 일종의 유의(儒醫)이기도 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자국의 역사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인본 사상', '온정주의'의 분칠을 해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극진한 건강 관리'를 들먹이며 인간 소유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노예주들이 했던 짓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2020년대에 하고 있다. 명색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국이 과거에 운용한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선 기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한국학 연구자인 브리검영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비는 조선(특히 전기)의 양반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자기 물건이 망가지고 없어지는 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같은 지붕을 이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닌 가축이라도 다치고 병들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낫게 해주려고 한다. 조선은 말의 건강을 보살피는 마의(馬醫)가 있던 나라다. 하다 못해 집에서 쓰던 의자 다리가 부러져도 당장 버리기보다는 고쳐쓰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병에 걸린 노비를 바로 용도폐기 안하고 치료해 줬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처우'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참고로 그 '미담'에 등장하는 '착한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 구타 전설의 주인공 묵재 이문건이다. 이문건은 그렇게 남을 아프게 하는 데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학에도 나름 상당한 관심과 지식이 있던 일종의 유의(儒醫)이기도 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자국의 역사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인본 사상', '온정주의'의 분칠을 해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극진한 건강 관리'를 들먹이며 인간 소유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노예주들이 했던 짓이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2020년대에 하고 있다. 명색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국이 과거에 운용한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선 기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서, 한국학 연구자인 브리검영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Most Americans beat themselves up about how awful they were about slavery. Most Koreans let it slide, like well, we weren't so bad. In reality, I think that both are wrong. In reality, I think that both are wrong.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노비제도에 대해 우린 뭐 그닥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 실제로는 둘 다 정말 나쁜 건데.
영화 기생충 두번 본 미국인 반응! 기생충이 미국에서는 청불?](9:16)
6. 영상 ✎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진보위키에서 가져왔으며 CC BY-NC-SA 3.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성미, 가축보다 못한 노비의 이름, 〈고문서향기〉, 호남기록문화시스템
(2)다 같은 애는 아니다.
(3)심희기, 〈16세기 이문건가의 노비에 대한 체벌의 실태분석〉, 《국사관논총》 제97집, 2001.
(4)정성미, 〈조선시대 사노비의 사역영역과 사적영역〉, 《전북사학》 제38호, 2011.
(5)김종성, 동정 받지 못한 노비의 죽음, 《조선노비들, 천하지만 특별한》, 예담, 2013.
(6)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4일 임신 1번째기사
(7)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8일 병자 2번째기사,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4번째기사,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30일 무인 2번째기사, 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기묘 2번째기사
(8)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9)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30일 무신 2번째기사
(2)
(3)
(4)
(5)
(6)
(7)
(8)
(9)